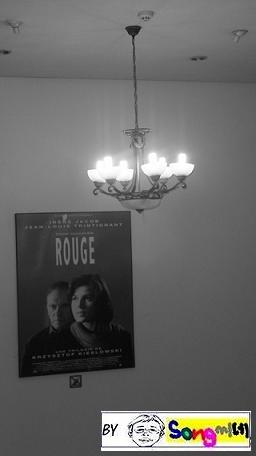사람들은 극장을 찾는다.
나 역시 영화가 좋아서 극장을 찾는다.
하지만 어느 극장을 가던간에 북적이는 임파에 볼려고 하는 영화는 매진이라는 글자만 보인다.
그래서 그런걸까?
멀티플렉스는 편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인간적이지는 못하다.
극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인적이 드문 극장들도 둘러보게 될 경우가 있다.
혹은 내가 보고픈 영화가 달랑 한 곳에서만 상영될 때도 나는 그 극장을 향해 달려간다.
필름포럼...
하지만 40, 50대 어른들에게는 이 곳은 많은 이들에게 추억이 가득한 극장이다.
낙원상가 앞 허리우드 극장...
일부는 아직도 여기를 이렇게 기억한다.
악기 상가가 모여 있고 낡고 허름한 아파트가 모여 있는 이 곳...
이 곳으로 들어서면 마주치는 것이 바로 순대국밥을 파는 골목이다.
드러서자 마자 돼지껍데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 냄세가 싫어서 이 골목을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순대국밥도 못먹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따끈한 순대 국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밤이 되면 많은 탑골공원에서, 종묘공원에서 올라온 어르신들이 작은 간의 의자에 걸터 앉아 술한잔을 기울이며 국밥 한그릇에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한다.
살이 쩌서 이제는 날 수 없는 비둘기떼와 호시탐탐 먹을꺼리를 찾아 골목을 배회하는 길고양이의 모습도 여기서는 분명 낮설지는 않은 것 같다.
경계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녀석을 같이 뚫어져라 바라본다.
낙원상가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보수중'이라고 쓰여진 나무로 만든 계단이다.
건물의 역사가 말해주듯 이 곳의 튼튼하던 콘크리트 돌계단도 이제는 수명을 다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이 곳의 역사만큼이나 엘리베이터 역시 매우 오래된 것이었다.
'웅~' 거리는 소리에 혹시 저 엘리베이터가 멈추지나 않을까 걱정을 한 적도 있었으니깐...
하지만 얼마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내부가 싹~ 바뀌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잔잔한 클레식이 흘러나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낡은 엘리베이터는 '웅~' 거리면서 나를 맞아주고 있었다.
"인터넷 예매인데요... '사무라이 픽션 2' 한 장이요..."
그래도 나는 아직 인터넷에 익숙하다.
더구나 발권기가 있는 극장이라면 나는 매우 편하다.
물론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그것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았고 그 것을 다시 매표소에 가서 휴대폰 통째로 보여줘야 만이 표를 얻을 수 있는...
낙원상가 4층...
옥탑방처럼 생긴 이 곳에 극장이 있다.
그리고 이 옥탑방 같은 마당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
'아름답다!'를 외쳐야 할 것 같은데 고층 빌딩 숲밖에 보이지 않는 이 곳에서 도무지 아름다움이란 없다.
극장 정면의 낙원 아파트는 이제는 유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아마 이 아파트가 당시 생겼을 때만 해도 이 곳의 완공은 당시 아마도 획기적인 뉴스였음은 분명하다.
서편제, 투캅스, 꽃잎, 칠수와 만수...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영화는 몇 편 되지 않는다.
더구나 '칠수와 만수'와 같은 오래된 영화는 기억조차 없다.
'21세기를 여는 허리우드 극장'이라는 간판은 정작 21 세기가 다가왔음에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현재 필름포럼에서는 두 개관에서 세 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옆의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는 유럽 영화제 기간중이다.
최근 그나마 예술영화관을 살리자는 운동 덕분에 서울 아트 시네마는 찾는 이들은 조금은 많아진 것 같다. 하지만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필름포럼을 생각하면 그렇게 차이는 없어보인다.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는 곳은 얼마전까지 이 곳 어르신들의 쉼터였던 '카바레 1, 2, 3'이 있던자리이다.
카바레라는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여기선 그냥 성인 콜라텍이라고 불리워도 무방하다.
어르신들이 이 곳에서 가볍게 스트레스를 풀고하던 곳이었는데 아마 여기도 이제는 장사가 잘 안되는 모양인가 보다.
완전 출입금지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곳의 '출입금지' 푯말을 금세 사라지고 없었다.
이 곳도 낡은 극장이었지만 어쩌면 이 곳에서도 역사는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는 '메트릭스 2'의 홍보 스티커를 보면서 말이다...
극장안 손님은 나 포함해서 겨우 다섯명이 전부였다.
밤 8시 50분...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서글픈 마음이 든다.
나는 얼음도 없고 살짝 김이 빠진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썰렁한 입장, 그리고 외로운 퇴장...
오히려 밝게 켜져 있는 조명이 이 곳에서는 사치같아 보였다.
루즈...
어디서 많이 본 영화 포스터이던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영화 키에슬로프스키의 삼색 삼부작 중 '레드' 였던 것이다.
퇴장로를 향하는 길에 밝게 비춰진 조명과 포스터 한 장은 오히려 우울해 보이기까지 한다.
포스터 속의 주인공들처럼...
현재 필름포럼처럼 경영난에 시달리는 작은 극장들은 의외로 많다.
명보극장은 5관 건물 중 실제 극장에 사용되는 건물은 세 개관 뿐이며 시네코아는 구사일생으로 스폰지 하우스와 한 외식업체, 그리고 어학원 하나가 입점하였다.
점차 서울의 오래된 건물은 서서히 리모델링을 진행중이거나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려고 계획중에 있다.
얼마나 많은 극장이 살아남고 죽어나갈지는 모를 일이지만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일은 아쉬운 일이다.
아직 보지 못한 영화 중에 차이밍량 감독의 영화중에 '안녕, 용문객잔'이란 영화가 있다. 사라지는 극장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영화 '친구'의 촬영장소로 알려진 부산 삼일극장은 몇 달전 그 수명을 다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좋은 영화를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극장을 떠나보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하다.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 일기는 일기장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픈 에디터는 괴롭다! 나도 괴롭다... (0) | 2007.07.14 |
|---|---|
| 비정규직에 대한 짧은 생각... (0) | 2007.07.11 |
| 여러분의 지갑에는 얼마나 많은 적립카드가 있나요? (0) | 2007.04.15 |
| 즐거운 뉴스, 행복한 뉴스는 없나요? (0) | 2007.03.26 |
| 송년의 밤은 이랬습니다! (0) | 2006.12.19 |